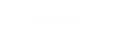- 등록일 : 2024-03-27
- 조회수 : 56
- 작성자 : 대학신문사
[인터넷 전주대신문, 업로드일: 2024년 3월 27일(수)]
공감 권하는 사회

유인혁 교수
(한국어문학창작학부)
두 손바닥을 T자로 교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 T야?”
이 밈은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 검사의 T 타입을 희화화한 것이다. MBTI 검사는 인간의 판단 기능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T(사고형)로서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타입이다. 또 하나는 F(감정형, Feeling)로서 인간관계와 상대방의 감정 등을 우선시하는 타입이다. 그리하여 “너 T야?”라는 언술은 동정, 위로를 원하는 사람에게 눈치 없이 사실관계를 따지고 드는 사람을 비난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다.
많은 대중적인 유행어가 그러하듯 “너 T야?” 역시 우리 사회의 심오한 문화적 층위를 보여준다. 이 밈은 우리 사회가 바야흐로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배려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넌지시 알려준다. 이른바 ‘정의 민족’이라는 자화자찬이 무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공감력 없는 괴물에 대한 으스스한 사연들이 만연하다. 몸이 아파 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기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나’라며 으름장을 놓는 상사나,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온갖 막말을 던지는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흔하다. 심지어 우리는 이태원에서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가 하면, 유가족들에게 자식을 못 말렸다며 일침을 놓는, 그런 괴물들과 함께 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 T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력과 배려심을 계발할 필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많은 유행어가 그러하듯 “너 T야?” 역시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 밈이 이른바 T 성격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멸칭이어서 혐오 발언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타자화의 방식은 T 유형, 혹은 그러한 유형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열등하거나 적어도 비사회적이며 비협조적인 부류로 낙인찍는다.
씬 야오(Xine Yao)가 그의 저서 <탈정동(Disaffected)>(Xine Yao, Disaffected, Duke University Press, 2021)에서 다시금 강조한 바에 따르면, 공감은 종종 배제의 정치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의 공감력은 극히 차별적으로 발휘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까운 존재들에게 공감한다. 나는 길에서 마주치는 귀여운 고양이들에게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평생 보지 못한 산호초에게는 덜 공감한다. 우리는 근처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공감한다. 그러나 먼 나라의 난민에게는 덜 공감한다. TV에서 피부색이 다른 어린이의 고통을 호소하는 공익광고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볼멘 소리를 한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이다.
이때 공감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를 긋는 문화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사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먼저, 그 다음은 우리와 가까운 존재들에게 공감의 영역을 할애한다. 즉 비슷한 처지의 존재들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과 같은 타국, 우리 사회 안의 이민자, 반려동물 이외의 짐승들에게는 얼마든지 냉정하거나 혹은 가학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남인가’라는 정서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작동하며, 그 영역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차별을 야기한다.
다시 MBTI로 돌아가보자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전제된 F들은, T들에게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너 T야?”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 사회의 주류인 나(F)에게 그들(T)을 배려하거나 포용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만약 F가 진실로 F라면, 공감하기 어려운 대상을 이해할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가장 진실된 공감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타자에게 미칠 때 그 빛을 발한다. 우리는 다른 성(性)의, 다른 세대의,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에게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심지어 인간은 다른 종(種)의 동식물에게 사랑을 쏟고, 그들의 생로병사에 공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다.
이제 신학기다. 모든 사람들이 낯선 이들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에게 끌린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다. 하지만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적어도 “너 ◯◯야?”라고 선을 긋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 인용 가능(단,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람)